
초미세먼지의 크기가 작아서 생기는 문제는 많다. 작으므로 몸속 깊이 파고들 뿐만 아니라 ‘연마력’도 강해진다. 연마란 식칼이나 주머니칼을 숫돌에 간다는 뜻이다. 칼을 연마하면 무뎠던 칼날이 날카로워지는데, 이는 날 끝이 깎여나가는 것이다. 연마는 숫돌 표면의 입자가 작을수록 연마력이 세지며, 칼날도 가장 얇을 때 칼 드는 맛이 제일 좋다.
크기가 작으면 물체에 부딪히는 면적도 커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다. 여기에 정육면체의 물건이 있다고 치자. 이 물건의 모서리 수는 전부 8개이다. 이를 2등분 한다. 부피는 변하지 않지만, 모서리 수는 2배로 늘어난다.
각각의 작은 육면체를 또다시 2등분 하면 모서리 수도 배로 늘어날 것이다. 요컨대, 전체 부피는 변하지 않지만 잘게 쪼개질수록 모서리 수는 늘어난다. 같은 부피라고 하더라도 잘게 쪼개지면 전체 겉넓이가 커져서 그만큼 물체에 닿는 부분도 많아진다.
즉 어딘가에 부딪칠 때마다 상처를 많이 입힐 수 있다. 단, 상처는 작게 생긴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 개의 작은 상처가 질병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쥐를 이용해 초미세먼지(PM2.5)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 실험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초미세먼지(PM2.5)를 체내에 넣고 ‘급성(急性) 증상’을 관찰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알게 모르게 초미세먼지(PM2.5)가 몸속에 쌓여 병이 천천히 깊어지는 ‘만성 증상’이다. 이 경우 병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써볼 수도 없는 상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체내에 쌓여만 가는 초미세먼지(PM2.5)는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 유발 요인이다.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해서 인체에 깊숙이 파고들며, 미세해서 기관(器官)의 많은 부위를 손상시키고, 미세해서 조금씩 상처를 입힌다.
초미세먼지(PM2.5)는 고체형이 있는가 하면 액체형도 있다. 같은 고체형 입자물질이어도 황사 같은 무기물이 있는가 하면, 삼림 화재로 생긴 유기물도 있다. 물질 자체에 독성이 있는 입자도 있으며, 무독성 입자도 있다. 대기 중에는 초미세먼지(PM2.5)에 속하는 다양한 입자가 떠다닌다. 초미세먼지(PM2.5)는 발생 과정이나 원인(인공·자연 발생적)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으나, 크게 보면 다음의 3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분진(티끌)이다. 고체가 잘게 부서져 미세해진 물질이다. 본래의 성분은 변하지 않고 잘게 쪼개진 것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분진으로는 황사나 흙먼지의 입자, 화산재, 물에 떠내려온 나무나 해안에 밀려온 해조류가 분해된 것 따위가 있다. 인공적으로 생긴 분진으로는 타이어나 도로의 아스팔트가 깎이면서 발생한 티끌 등이 있다. 입자의 모양은 여러 가지이고, 크기는 고르지 않다.
둘째, 금속 퓸(fume)이다. 온도의 변화로 물이 수증기가 되었다가 다시 물이 되듯이, 금속도 온도에 따라 기체가 되기도 한다. 분진 가운데에서도 금속이 열을 받아 증발된 뒤에 다시 응축되어 미세 입자로 변한 물질을 ‘금속 퓸’이라고 한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공적으로 생긴 금속 퓸이다. 예컨대 용접할 때는 고온에서 금속을 녹이는데 이때 금속 퓸이 발생하여 폐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잘게 부서진 분진과는 달리 다시 엉기어 굳어져 생긴 금속 퓸은 그 모양과 크기가 비교적 고른 편이다.
셋째, 연기다. 물질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 속에는 갖가지 입자(고체·액체)나 가스(기체)가 섞여 있다. 그 종류는 태우는 물질에 따라 다르지만, 목재나 석유를 태우면 그 연기에 탄소 성분의 초미세먼지(PM2.5)가 많이 들어 있다. 이 입자는 모양이 둥그스름하며 서로 엉기어 덩어리가 되기도 한다.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연기로는 차량의 배기가스, 화력발전소의 연기, 들불의 연기, 석유난로의 연기, 조리할 때의 연기, 담배연기 등이 있다. 가정에서도 의류 건조기나 침구에서 초미세먼지(PM2.5)가 생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연기로는 산불이나 들불로 인한 연기가 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초미세먼지(PM2.5)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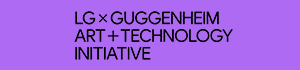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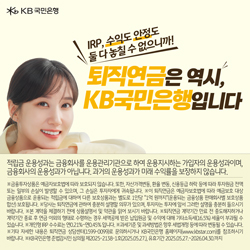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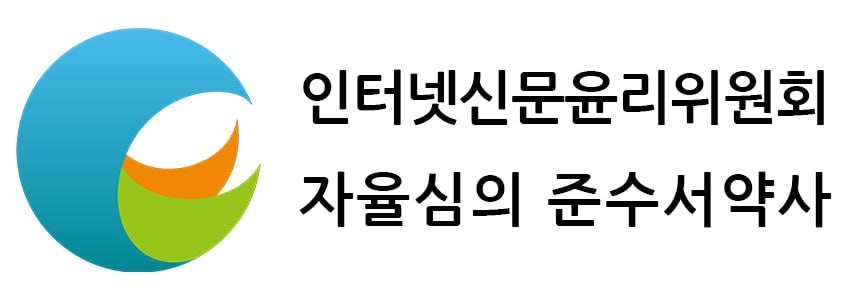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