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전 세계에서 산불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발생했던 울진 산불 역시 그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영향 구역은 약 2만 헥타르인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로 볼 때도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규모인지는 잘 상상이 안 갈 것이다. 2만 헥타르는 대구시의 면적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상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이번 울진 산불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무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 나무 역시 내상을 입어 고사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제나 푸르렀던 울진의 산은 더 이상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 나무들은 화재로 새까맣게 그을렸고, 잎은 다 타버렸다. 금강송 역시 겉에서 볼 때는 건강한 나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고 주변이 다 불에 타버린 경우에는 건강해 보이는 나무들도 오래 가기 힘들다고 한다. 소나무의 경우에는 특히 다른 나무들에 비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 토양 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불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복원 과정이 이뤄질까? 보통 불에 다 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나무를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조차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진행이다. 산세가 험한 곳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야 하고 인력과 자원 등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고, 또 나무가 자리를 잡고 울창하게 퍼지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숲의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은 잡아야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산불로 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나무를 심기 전에는 산의 지형을 살펴봐야 하고 토양, 현장 상황에 맞는 수종을 봐야 하고 어려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최근 전국 곳곳에서 수십 년 전 산불이 발생한 곳의 복원 지역을 살펴본 바 있다. 일부는 자연으로 자란 나무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상황과 맞지 않은 종류의 나무를 빨리 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심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어난 바 있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라면 복원 과정에 힘쓰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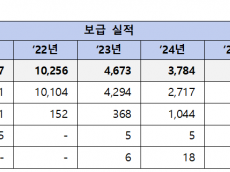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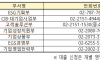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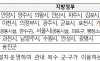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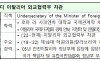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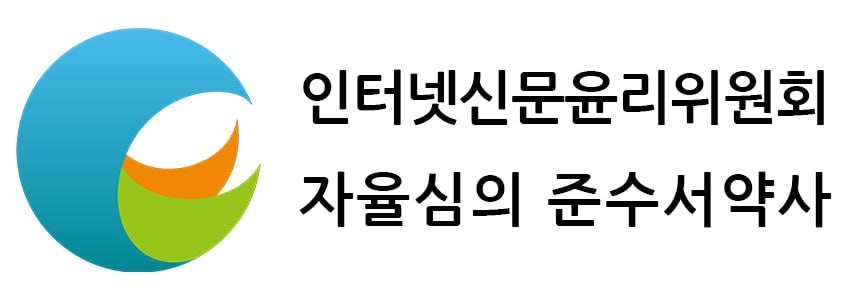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