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자의 개념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에 정의 되어있다. 철근콘크리트 균열·노출과 같은 ‘내력구조부 하자’와,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차도·보도의 침하, 누수·누전, 소방·난방·가스의 작동불량 및 파손과 같은 ‘시설공사별 하자’로 크게 나뉜다. 쉽게 말하면 중대하자는 입주민 안전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다.

‘콘크리트 균열’의 경우 ‘21년, ‘22년 0건에서 지난해, 올해 6월기준 각 14건, 4건으로 증가했고 ‘기계소방설비 불량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8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뛰어넘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건축물 누수’는 지난해 79건에서 올해 6월 이미 7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관누수’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41건에서 올해 6월 이미 3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7년간 하자 소송 패소로 인해 LH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소송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도 약 2,94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패소 사건과 판결금을 보면 2018년 19건 155억 원, 2019년 23건 446억 원, 2020년 36건 538억 원, 2021년 34건 524억 원, 2022년 19건 409억 원, 2023년 31건 532억 원, 올해 8월 기준 14건 332억 원 이다.

반면 천문학적 판결금을 지급해야 하는 LH가 구상금 소송 등을 통해 지급 판결금을 회수한 비율은 전체 대비 약 34%로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금이 확정된 연도별 판결금 중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회수한 금액과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71억 원 46.14%, 2019년 204억 원 45.69%, 2020년 229억 원 42.59%, 2021년 190억 원 35.55%, 2022년 199억 원 48.66%, 2023년 75억 원 14.08%,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32억원 9.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판결금을 회수 하지 못하는 사유에는 ‘설계상 오류’ 등 LH의 귀책 사유도 포함되어 있다.

권영진 의원은 “중대하자는 발생하는 경우 입주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만큼, 완전히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주거 질 향상을 위해 힘써야할 LH가 입주민들과 배상 소송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며 “설계·시공·감리 관리에 철저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권영진 의원 "설계 및 시공단계 품질검수 강화, 품질서비스용역 시행과 함께 일선 현장에 품질및 하자관리 교육을 실사하는 등 기술인력 제고를 통해 중대하자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술인력의역량 향상을 통해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자접수시 신속한 보수로 입주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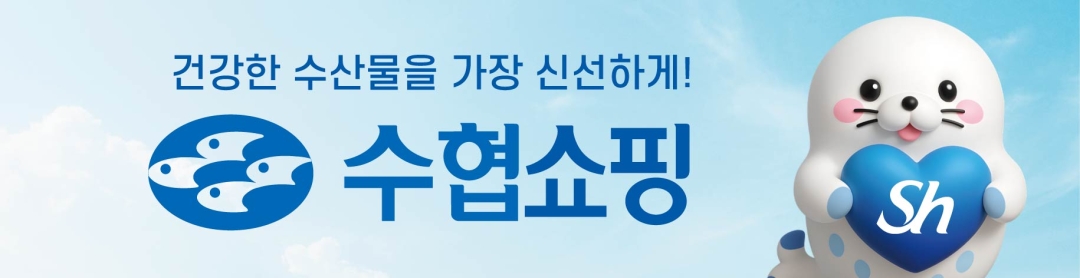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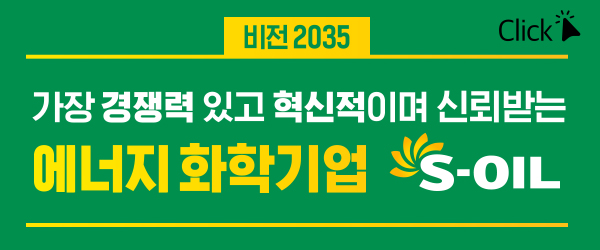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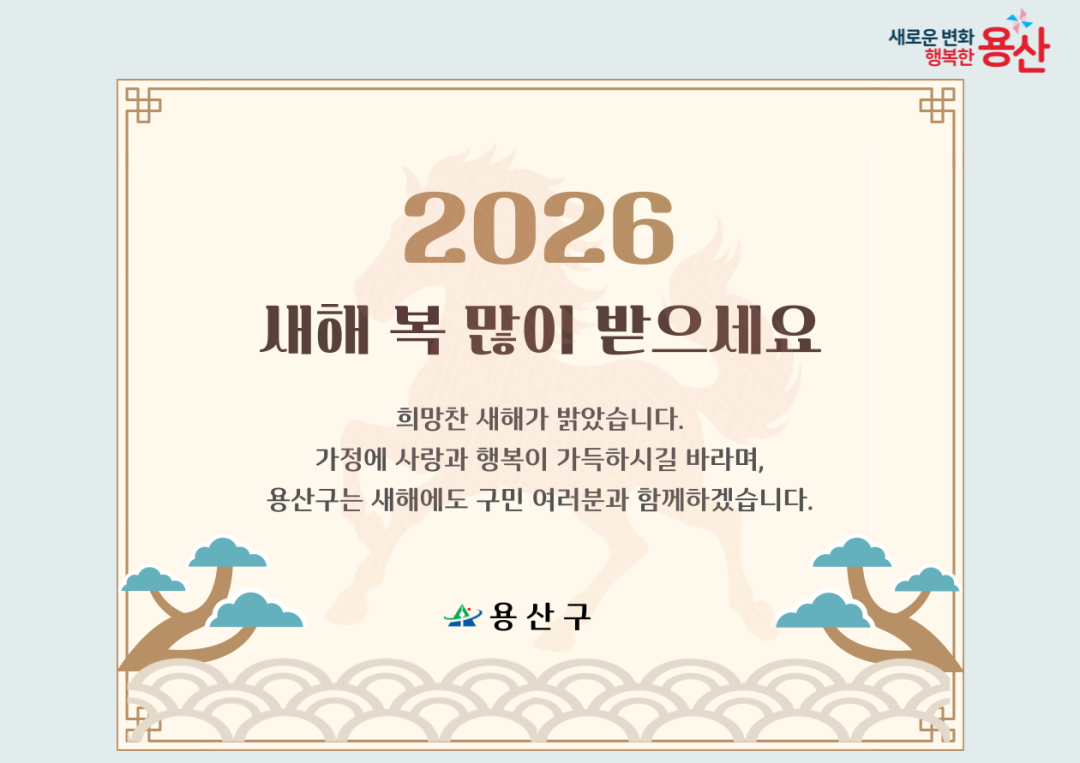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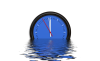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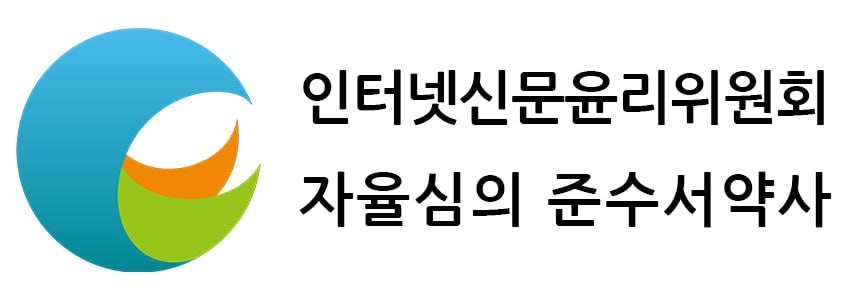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