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3년 12월 기준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 네이버 2.9%, 쿠팡 1.3%, 카카오 1.1% 순(과기정통부)으로 나

특히 가장 트래픽 점유율이 큰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 증가는 유튜브의 가파른 상승세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국내 모바일 앱 중 월 평균 이용시간(MAU) 2위에 머물렀던 유튜브는, ’23년 12월을 기점으로 1위를 점했고, 이제는 2위인 카카오톡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구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과 ICT 서비스의 발달로 데이터 소비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증권 리서치(’24.5.22.)에 따르면, ’18년 6GB였던 인당 트래픽은 5G 도입 후 ’23년 18GB로 3배 증가하였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바일 경제 보고서>는 향후 1인당 트래픽 수준이 87GB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구글은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다양한 환경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해외( Shift Project: 디지털 기술의 환경적 영향을 연구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 )의 연구에 따르면, 1시간 동안 HD 화질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약 3.2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자동차로 12km 이상을 주행한 수준에 해당한다. 더불어 AI 서비스 운영에는 머신러닝 등을 위한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설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글이 구축한 데이터센터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김우영 의원은, “국내에서만 연간 약 6,534만 ( 국내 소비자 월평균 유튜브 이용시간 1,021억분 ÷ 60분 × 3.2kg × 12개월 = 약653억kg = 6,534만톤 )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 3억톤( Shift Project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3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발표 )의 5분의 1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후위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구글은 글로벌 지향점인 넷제로(Net 0)에 역행하고 있으며, 수익에만 눈이 멀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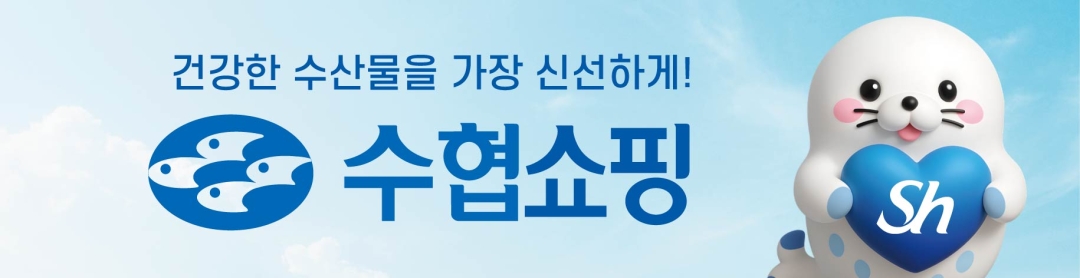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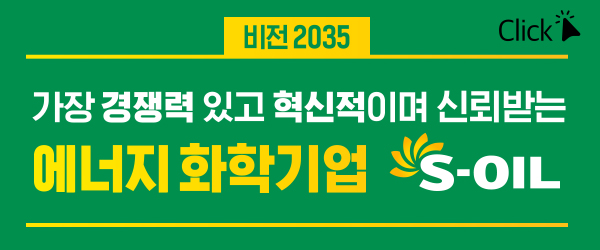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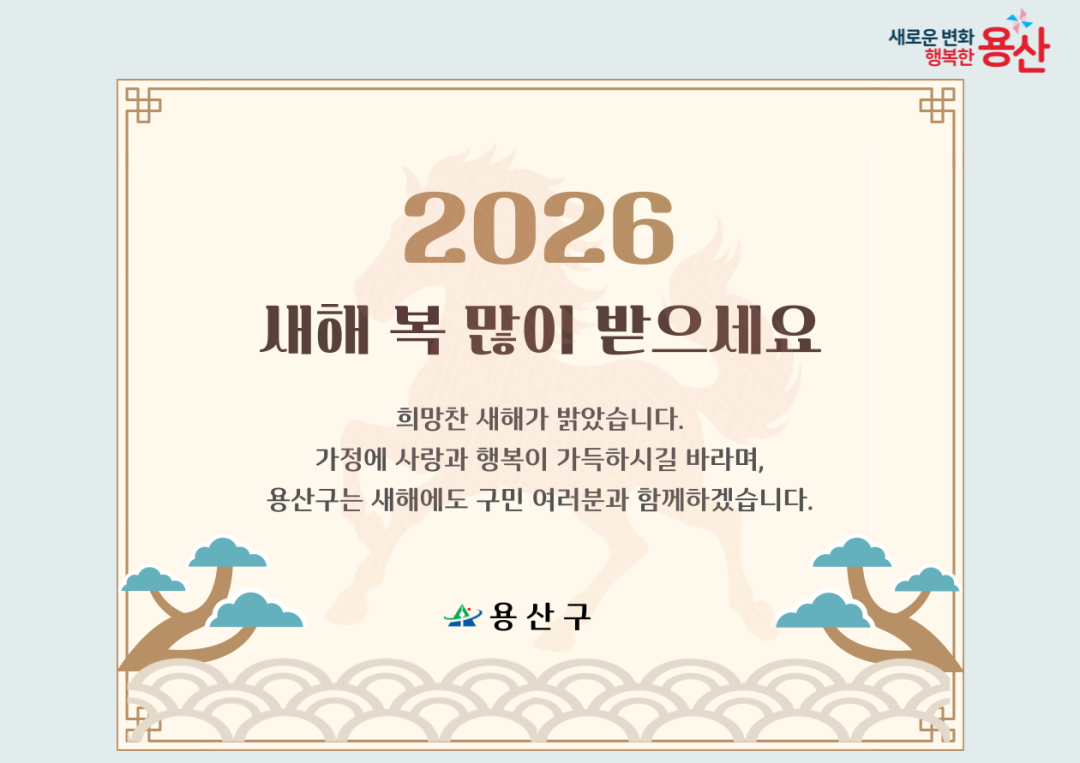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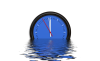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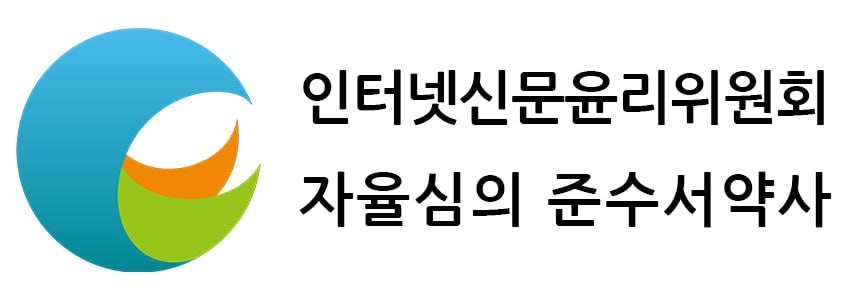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