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토론회에서 정재욱 전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장은 “청년 신규채용 중단, 불안정 고용, 1인가구 800만 시대에 사회적 고립과 절망감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정책은 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 프로그램만 제시될 뿐 민관 협력과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애 사단법인 씨즈 대표 역시 “공공기관은 다양한 유형의 은둔형 청년을 지원할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하다”며 “온라인 모임과 자조공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반 돌봄망 구축, 바우처 등 이용자 선택권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지원센터 설치는 긍정적이지만 공공 업무시간에 맞춰 ‘청년이 스스로 찾아오길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공공이 모든 것을 직접 하려 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서울시가 38억 원을 쓰고도 전체의 1%만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현실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은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민간이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국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외 토론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영국 ‘외로움부 장관’과 일본 ‘이바쇼’ 개념을 참고한 커뮤니티 정책 ▲예방적 접근과 인식개선 강화 ▲1인가구 공동체 주거 모델 ▲지역 공공인프라와 민간 단체 협력 허브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탄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마련됐다. 오는 9월 9일에는 세 번째 토론회로 ‘근심주택이 된 청년 안심주택’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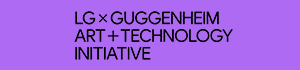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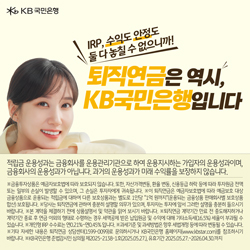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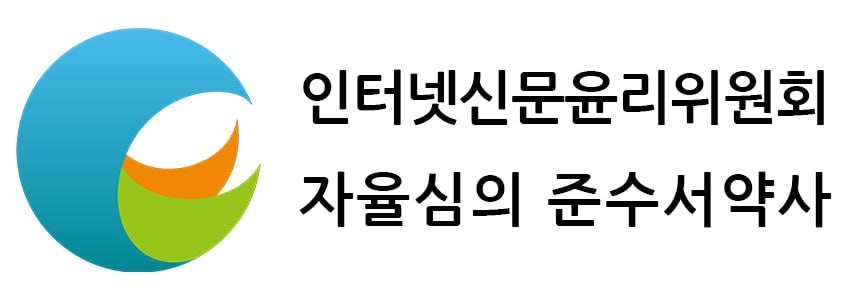
댓글
(0)